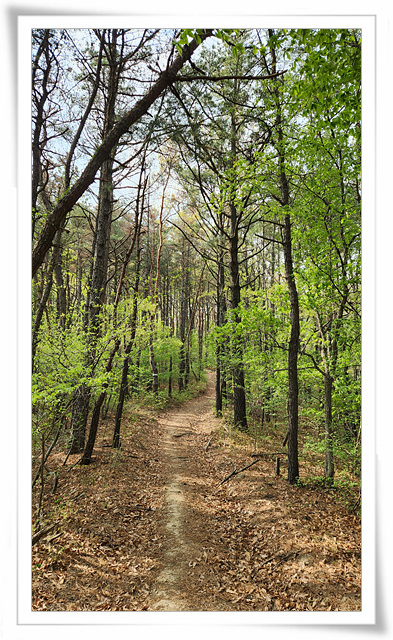기예(技藝)에 통달한 양지(良志) 스님이 주석(駐錫)한 석장사지(錫杖寺址)
석장사지(錫杖寺址)는 경주 송화산(松花山, 일명 수도산) 삿갓봉 아래 해발 95∼100m 사이(석장동 산81-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절터로 신라 선덕왕 때 조각승 양지(良志) 스님이 주석(駐錫) 하였던 절이다. 경주 도심에서 형산강 서쪽 편에 자리 잡은 송화산(松花山)은 삿갓봉(234.7m)과 옥녀봉(275.6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주 사람들은 흔히들 수도산이라 부르고 있다.

절터는 남향을 하고 있으며, 북향은 산죽(山竹)이 빙 둘러싸고 있고 서편에는 폭 5m 정도의 계곡이 있다. 근처 주민들은 이곳을 ‘절골’이라 부른다.


석장사지(錫杖寺址)에서 출토 된 유물 중 석장(錫杖)이라는 묵서가 쓰인 백자대접이 출토되어 석장사지(錫杖寺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신라 인화문토기부터 조선전기 분청사기와 조선후기 백자 등이 출토되어 조선시대까지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양지(良志) 스님은 기예(技藝)에 통달하고 덕이 충만(充滿)했다. 그 조상이나 고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오직 신라 37대 선덕왕(宣德王, 재위기간 : 780년 4월 ~ 785년 정월) 때에 자취를 나타냈을 뿐이다. 석장(錫杖) 끝에 포대(布帶) 하나를 걸어 두기만 하면 그 지팡이가 저절로 날아 시주(施主)의 집에 가서 흔들리면서 소리를 냈고 그 집에서 이를 알고 재(齋)에 쓸 비용을 여기에 넣는데, 포대가 차면 날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그가 있던 곳을 석장사(錫杖寺)라고 했다.
‘양지(良志)란 무엇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공장(工匠)을 의미하며, 석장(錫杖)은 머리에 여섯 개의 방울이 달려 흔들면 소리가 나는 지팡이로 스님이 탁발할 때 인기척을 내거나, 길을 다니면서 짐승을 쫓을 때 사용했을 것이다.

영묘사(靈廟寺) 장육삼존상(丈六三尊像)과 천왕상(天王像), 또 전탑(殿塔)의 기와와 천왕사(天王寺) 탑(塔) 밑의 팔부신장(八部神將), 법림사(法林寺)의 주불삼존(主佛三尊)과 좌우 금강신(金剛神) 등은 모두 그가 만들었다.
또 필찰(筆札)에도 능하여 영묘사(靈廟寺)와 법림사(法林寺)의 현판을 썼고, 또 일찍이 벽돌을 새겨서 작은 탑 하나를 만들고, 아울러 삼천불(三千佛)을 만들어, 그 탑을 절 안에 안치했다.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절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암자와 같은 작은 절로 추정되지만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양지스님이 주석하였던 7세기 후 반경에는 석장사내에 전탑으로 만들어진 삼천불탑이 존재 했을 정도면 고려, 조선시대보다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석장사지는 창건된 이후 여러 차례 증축되는 과정에서 유구가 훼손되고, 이전시기의 건축부재와 석물들이 재사용되어 창건 때의 절의 전체적인 윤곽은 알 수가 없다.

석장사지에 대한 최초 조사는 일제강점기 때 경주고적보존회의 오사카 긴타로가 하였다. 당시 도굴이 성행하였고 대부분의 유구가 교란 된 상태였다. 절터는 소나무 숲에 묘지가 있었고 초석과 와편 등이 확인되었고. 절터 주변의 일부 가옥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형주좌초석이 석장사지에서 옮겨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장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86년과1992년에 2차에 걸쳐 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박물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며, 다수의 기와 편과 탑상문전(塔像紋塼), 소조상편, 소형금동불 등 다양한 불교관련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석장사지에서 출토된 200여점의 탑상문전(塔像紋塼)에는 두 분의 부처님과 그 사이에 탑을 표현하였는데 삼천불탑 조영 시 재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크기와 문양에 따라 6∼7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종류별 크기가 다른 이유는 전탑조성 시 각 위치에 따라 전돌의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났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탑상문전은 경주 삼랑사지와 울산 능소사지, 울주 불영사, 청도 운문사 등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이들 사지에도 석장사지와 유사한 전탑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탑상문전(塔像紋塼)에는 탑상(塔像) 전면(塼面)에 연기법송(緣起法頌) 20자가 새겨져 있는데 크기는 높이 8cm, 폭 6.5cm, 두께 2cm로 글자크기는 약 0.5cm이다. 연대는 7~8세기 경으로 양지스님의 글씨로 추정된다.
내용은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남을 여래(如來)께서 말씀하셨노라. 저 법은 인연을 다한다는 것 이것이 대사문의 설법일세(諸法從緣起」 如來說是因」 彼法因緣盡」 是大沙門說」』

소조상은 20여점이 출토되었는데, 사천왕상이나 금강역사상 등의 신장상편과 보살상편으로 추정되면 소조상편들은 모두 뒷면이 편평한 부조상이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기록된 석장사 삼천불탑의 벽면에 부착했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명문전이10여점 출토되었는데, ‘西北’, ‘三’, ‘下層南’ 등의 글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탑축조 시 벽돌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의해(意解) 양지사석(良志使錫) 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 양지(良志)는 그 조상이나 고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오직 신라 선덕왕(宣德王) 때에 자취를 나타냈을 뿐이다. 석장(錫杖) 끝에 포대(布帶) 하나를 걸어 두기만 하면 그 지팡이가 저절로 날아 시주(施主)의 집에 가서 흔들리면서 소리를 낸다. 그 집에서 이를 알고 재(齋)에 쓸 비용을 여기에 넣는데, 포대가 차면 날아서 돌아온다. 때문에 그가 있던 곳을 석장사(錫杖寺)라고 했다.
양지의 신기하고 이상하여 남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모두 이와 같았다. 그는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기예(技藝)에도 통달해서 신묘함이 비길 데가 없었다. 또 필찰(筆札)에도 능하여 영묘사(靈廟寺) 장육삼존상(丈六三尊像)과 천왕상(天王像), 또 전탑(殿塔)의 기와와 천왕사(天王寺) 탑(塔) 밑의 팔부신장(八部神將), 법림사(法林寺)의 주불삼존(主佛三尊)과 좌우 금강신(金剛神) 등은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영묘사(靈廟寺)와 법림사(法林寺)의 현판을 썼고, 또 일찍이 벽돌을 새겨서 작은 탑 하나를 만들고, 아울러 삼천불(三千佛)을 만들어, 그 탑을 절 안에 모셔 두고 공경했다. 그가 영묘사(靈廟寺)의 장육상(丈六像)을 만들 때에는 입정(入定)해서 정수(正受)의 태도로 주물러서 만드니, 온 성 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운반해 주었다. 그때 부른 풍요(風謠)는 이러하다.
왔도다. 왔도다. 인생은 서러워라.
서러워라 우리들은, 공덕(功德) 닦으러 왔네.
지금까지도 시골 사람들이 방아를 찧을 때나 다른 일을 할 때에는 모두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은 대개 이때 시작된 것이다. 장육상(丈六像)을 처음 만들 때에 든 비용은 곡식 2만 3,700석이었다.
논평해 말한다. “양지 스님은 가위 재주가 온전하고 덕이 충만(充滿)했다. 그는 여러 방면의 대가(大家)로서 하찮은 재주만 드러내고 자기 실력은 숨긴 것이라 할 것이다.”
찬(讚)해 말한다.
재(齋)가 파하여 법당 앞에 석장(錫杖)은 한가한데,
향로에 손질하고 혼자서 단향(檀香) 피우네.
남은 불경 다 읽자 더 할 일 없으니
소상(塑像) 만들어 합장하고 쳐다보네.」

석장사지(錫杖寺址)를 찾아가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으나 휴앤락 오토캠핑장을 통과해서 가는 길과 소나무 재선충병 적치장을 지나서 가는 길이 가장 쉽게 찾아 갈수 있는 길이다.